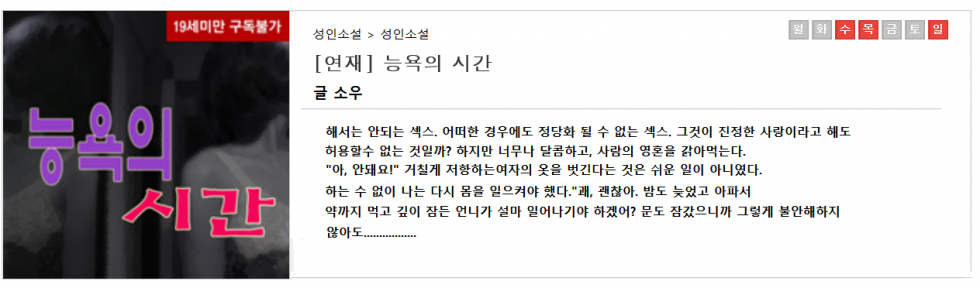
제 4장 검정색 팬티 (3)
“불빛이 좀 어두운 것 같지 않아? 처제?”
“그런 것 같기도 하네요. 형부.”
“그것 보라고. 어휴! 손 댈 곳이 한두 가지가 아니겠어.”
나는 집 안 이곳저곳을 살폈다.
워낙 낡고 노후한 집안 탓에 짐작한 대로 손 볼곳이 적지 않았다.
“처제. 아무래도 안 되겠다.내가 집에 가서 옷 좀 갈아입고 밑에 내려가
필요한 것 좀 사가지고 와 본격적으로 손을 봐야겠어.”
“날도 더운데 .......힘들게 해서 어떡해요? 형부.”
처제가 울상을 지었다. 그 얼굴이 귀여워 보였다.
“하하하. 처제가 이ㅏ 왔는데. 형부로서는 당연히 할 일을 하는것뿐이야.뭘 그렇게 미안해. 해?”
그러자 울상을 짓던 처제가 다시 얼굴을 피며 말했다.
“형부. 대신 정리가 끝나면 우리 같이 저녁 먹어요. 제가 한턱 쏠게요.”
“그거 좋지!”
처제의 제안에 나는 흔쾌히 동의 했다.
나는 집으로 가기 위해 발걸음을 떼려다가 다시 처제 쪽으로 몸을 돌렸다.
“처제. 우리 이렇게 하자. 내가 옷 갈아입고 동네 밑으로 내려갈 건데 말이야.
아예 거기서 장까지 보고 올게. 삼겹살에 소주 어때? 오늘 이사를 온 터라 지금 집에는 아무 것도 준비되게 없을 거 아냐?”
그러자 처제가 소풍을 하루 앞둔 어린 아이 마냥 들뜬 표정으로 대답했다.
“좋아요! 형부.”
“그럼 그렇게 하는 걸로 하고 고기는 저 위에 정자에서 구워먹자고.
이사한 첫날부터 집. 방바닥에 기름기가 범벅이면 좀 그렇잖아. 어때?
근사하게 서울야경 바라보면서 한 잔 하는 거야. 오케이?”
내가 맨손으로 술잔을 들이켜 마시는 시늉을 하자 처제 또한 덩달아 신이 난 듯 했다.
“그. 그런데…….형부. 그 정자 에서 고기 구워 먹으면 안 되는거 아니에요?”
“그까짓 고기 구워 먹는다고 누가 뭐라 그래? 거기가 뭐. 국립공원이라도 돼?
걱정 하지 마. 아무튼 준비 좀 해가지고 이따 다시올게.처제.”
“네 그럼 그렇게 하세요. 아! 참. 형부 …….잠깐만요!”
처제가 부리나케 몸을 움직였다. 다시 나타난 처제의 손에는 지갑이 들려 있었다.
“난 또 뭐라고.쓰읍! 됐어. 얼마나 된다고. 내가 쏠게.”
“그래도…….”
“어허~ 괜찮다니까. 쓸 데 없는짓 하지 마. 이 형부를 뭐로 보는 거야?”
미안해하는 처제를 뒤로 하고 나는 집을 향해 발을 뗐다.
가진 건 불알 두 쪽밖에 없는 나였지만 그 불알이 거세게 출렁 출렁 거릴 정도로 힘껏 뒤었다.
이상 하게도 내 자신을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신바람이 났다.
나는 미친년이 널을 뛰듯 히죽히죽 거리며 더 빠르게 달려갔다.
필요한 모든 것들을 준비해가지고 다시 처제의 집을 간 나는 집구석을 본격적으로 손보기 시작했다.
막상 달려드니 의외로 손을 볼 곳이 많았다.
나는 나대로, 처제는 처제대로, 그리고 또 처제의 친구.헤리는 ‘헤리대로 각자의 역할을 맡아 부산하게 움직였다.
일이 끝난 것은 저녁이 다되어갈 무렵이었다.
“어이! 처제. 그리고 헤리씨…….둘 다 이리 나와 봐!”
나는 현관 문 밖에서 그녀들을 불렀다. 내 부름에 밖으로 나온 두 사람을 향해 말했다.
‘이 자물쇠는 말이야. 흐음…….지금 비밀번호를 설정해야하는데…….
내가 임의대로 정했거든. 앞 번호는xix이고 뒤의 번호는 xxxx 야."
처제와 처제 친구가 내가 문에 새로 설치한 도어 록을 유심히 바라본다.
“형부, 비밀번호 뒷자리는 제 휴대폰 전화 같은데…….앞번호는요?”
“으응. 둘이서 이집에서 같이 사니까 사실 헤리씨. 전화번호로 하려고 햇는데.
내가 헤리씨 전화번호를 모르잖아. 그래서 내전화번호 앞자리를 땄어."
“고마워요. 형부. 뭘 이런 것까지.....,”
“고맙긴. 아무리 허접한 집이라도 남자 없이 여자 단둘만 사는 집인데,
그럴수록 문단속을 더 철저하게 해야지. 그나저나 두 사람 다 일끝나려면 아직 멀었어?”
“아니에요. 우리도 다 끝났어요. 형부, 배많이 고프시죠?”
“응. 그러네. 이제 정리가 어지간히 끝났으면 올라가서 시원한 바람을 쏘이며 한 잔 하는 게 어때?”
“호호호. 형부. 콜!”
이삿짐 정리를 다 마친 처제가 홀가분하다는 얼굴로 대답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내가 바리바리 사가지오 온 것들을 각자 손에 하나씩 들고서는정자가 있는 곳으로 곧바로 향했다.
띰을 뻘뻘 흘리며 힘겹게 정자에 도착하자마자 처제가 들뜬 목소리로 소리쳤다.
“까악~너무 좋다! 헤리야. 저기좀봐. 죽이지 않니?”
팔각정에서 내려다보이는 탁 트인 서울의 전경이 오랜만에 이곳에 올라온 내 눈에도 근사하게 비쳤다,
저녁 어스름이 깔린 다리 위는 퇴근하려는 차들로 꾸역꾸역 밀려있어 보기가 답답했지만
그 다리 아래로 푸른 물결의 한강이 시원하게 펼쳐져 있어서 그런대로 운치가 있었다.
“자자! 감상은 나중에 천천히 하기로 하고 다들 허기졌을 테니 먼저 고기부터 굽자고,”
우리는 서둘러 고기를 구웠다.
처제와 처제 친구랑 어여쁜 여자 둘을 끼고 앉아있으니 온 세상천지가 다 내 것처럼 느껴져
나는 기분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었다. 올려놓은 고기가 불판에서 빠른 속도로 익어갔다.
“자. 고기가 이제 얼추 다 구워진 것 같으니까 우선 술 한 잔씩들 받아. 오늘 이사하느라 두 사람 다 수고했어.”
나는 두어자에게 술을 따라주었다.
“헤리야. 네가 우리 형부 술 따라 드려.”
처제의 말에 헤리씨가 들고 있던 내 빈 잔에 술을 따라주었다.
나는 술이 넘치지 않을까 잔에 시선을 내리깔며 조심스러운 손짓으로 술을 따라주는 처제친구를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화장기가 하나 없는 그녀의 민낯이 색다른 느낌을 주는 것 같앗다.뭐랄까.
전에 처음 만남에서도 느꼈지만 말로 형언할 수 없이 묘한 매력을 풍기는 여자였다.
그녀가 술을 다 따르고 얼굴을 들자 나는 재빨리 고개를 돌렸다.
“자~ 두 사람이 내 이웃이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건배!”
“호호, 고마워요, 형부.”
“크으!”
술잔을 내려놓고 나는 처제친구에게 다시 술을 따라주며 넌지시 물렀다.
“저기.........헤리씨는 기분이 어때? 이쪽으로 이사 온 것 말이야. 집은 마음에 들어?”
내질문 에 갑자기 당황스러운 표정으로 잠시어쩔줄을 몰라 하다가 그녀가 모기 같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조. 좋아요.”
형식적인 대답만은 아닌 것 같았다. 아까부터 그녀의 얼굴과 몸짓에도 약간 들뜬
기분의 흔적이 엿보여 나는 내심 흐뭇해하고 있던 참이었다.
“그런데 헤리씨는 진짜 말이 없네. 너무 말수가 적다 보니까 사람들한테 간혹 오해도 살 수 있겠다 싶은데.......”
“........”
그 말에도 처제 친구는 이렇다 할 대꾸가 없었다.
그러자 짧은 적막이 흘러 분위기가 갑자기 어색해졌다. 어색해진 분위기를 먼저 깬 것은 처제였다.
“형부. 사실은 …….얘가 말이에요. 목소리 콤플렉스가 있어요,
게다가 낯도 많이 가리는 편이고 지나치게 내성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 거니까 형부가 이해하세요.”
“어? 목소리가 어때서? 콤플렉스를 가질 정도로 나쁜 목소리는 아닌 것 같은데?
난 헤리씨. 목소리 좋기만 하던데 뭘.”
그런데 내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처제의 친구가 나한테 달려들 듯 몸을 숙이며 물었다.
“저. 정말이세요? 제목소리.......진짜 이상하지 않으세요?”
갑자기 돌변한 듯 한 처제친구의 태도에 나는 당황하고 말았다.
그냥 듣기 좋으라고 한 말에 그녀가 이럴 정도의 반응을 보일 줄은 몰랐다.
방금전에 그녀가 한 말이 내가 여태껏 들어본 말 중에 가장 길게 말한 듯했다.
당사자 앞에서는 그렇게 말했지만 솔직히 말해서 두 번 다시 듣고 싶지 않은 영 거북스럽기 짝이 없는 목소리였다.
이목소리 의 느낌을 뭐라고 표현해야하나.
걸걸하다고 말해야 하나 아니면. 허스키하다고 말해야하나.
남자 목소리도 아니 그렇다고 여자 목소리도 아닌. 이도저도 아닌 중성적인 목소리를 듣고 있노라니
몇 번 더 계속해서 듣다가는 온 몸에 두드러기가 날 성싶었다.
1화 처음부터 보기 -> 능욕 의 시간 제 1 화



 능욕 의 시간 제 22 화
능욕 의 시간 제 22 화
 능욕 의 시간 제 20 화
능욕 의 시간 제 20 화

